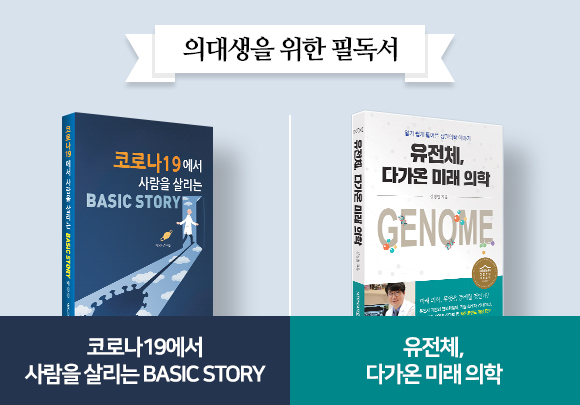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낮은 고도의 태양 아래, 안개꽃을 머리에 이고>
유해조 중앙대학교 본과3학년
#1 죽음의 분류
어느 아침, 외할아버지가 죽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어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삼가지만 외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명백했다.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하사, 한국에서는 뺑소니 피해자로, 김천 시 어느 한 모서리 집구석에서는 폭력적인 제왕으로, 문지방을 나서 외발을 내딛는 순간 절름발이 아버지로 살아왔다던 그는 영정사진으로 박제되었다. 집으로 뻗은 길 어귀에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 들려오면 온 집안이 시려 성에가 피어났으며 그럼에도 여섯 아이를 무사히 키워냈다더라. 허나 배나무 밭 어느 길섶을 나서다 직장암을 건네받아 유명(幽明)을 달리했다더라 하는 그의 동화를 나는 어머니께 구전으로만 들었다. 이것이 내 생에 첫 장례에 대한 기억이다.
장례식장은 각기 다른 상(喪)을 가진 사람들이 상(床)을 공유하듯 온 조문객들이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차려져 있었다. 내가 앉은 구석에선 온 가족들이 어스름히 모여들어 외할아버지의 역사를 읊으며 추억했고 다른 지류에서는 누군지 모를 이들이 누군지 모를 이를 추도했다. 수백여 명이 착석한 채 육개장을 목구멍으로 쑤셔 넣는 장관(壯觀)에, 각자의 몫의 슬픔이 차려입은 검정 옷에 숯처럼 묻어나와 삯을 잃고 표박했다.
그 합류점에 내가 내어준 슬픔은 오늘 죽은 다른 이의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슬픈 탓도 아니었다. 몇 번 말도 섞어보지 못한 동화 속 주인공의 죽음은 그다지 슬프지 않았기에. 다만 어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이 슬퍼서 그 슬픔으로 눈물을 내어 당신을 추모했다. 내 몫의 슬픔은 어머니의 슬픔이 슬퍼서 슬픈 슬픔이었다. 나의 슬픔과 누군지 모를 조문객들이 내어낸 슬픔과 역사를 읊조리는 어른들의 슬픔은 각기 다른 상(狀)으로 경계를 맞대고 섞이지 않았다.
누구의 죽음인지 팻말이 붙지 않은, 그러니까 TV나 인터넷으로 접한, 혹은 옆 호실의 망자(亡子)의 죽음은 종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죽음의 문고리에 내가 아는, 혹은 아는 이가 아는 사람의 이름표를 달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죽음은 슬픔으로 떠오른다.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은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느꼈던 ‘죽음이 슬픈 죽음’과 내가 느꼈던 ‘슬픔이 슬픈 죽음’으로 분류된다. ‘슬픔이 슬픈 죽음’이 토해낸 슬픔은 그 죽음을 ‘죽음이 슬픈 죽음’으로 여기는 이의 슬픔보다 급하게 사라지곤 했다. 이렇게 죽음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부가된 슬픔만큼 슬퍼하는 것이 나의 오래된 업무였다.
주저앉은 채 마주한 죽음마다 각기 다른 슬픔을 대롱대롱 매다는 것, 죽음에 맞서 기껏 내가 해온 것이란 고작 그 정도의 것이었다.
#2 죽음이 늘어진 병실에서
종양내과를 실습할 때였다. 교수님께서는 회진을 돌다가 본 어느 환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외할아버지와 같은 진단명을 건네받은 환자였다. 그 환자는 Cheyne-Stokes respiration을 보이기 때문에 곧 사망할 수도 있어서 오늘 밤 보호자들을 모이게끔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의 부고를 전해주셨다. 약간은 입꼬리가 주눅들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사망을 선고했다. 팔십 인생, 몇 년간의 병원 인생이 사망이라는 두 글자 단어에 농축되어 내뱉어졌다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병원의 눅눅한 공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사망선고가 누적되어 지층을 이루고 있었다.
누군가의 외할아버지이자 아버지였을 그 환자의 죽음은 교수님께 어떤 죽음이었을지. 또 정년이 되도록 긴 시간 동안 걸쳐온 흰 가운, 그 굵직한 선 곳곳에 찍혔던 수많은 마침표들은 어떠한가. 분명 누군지 모를 이의 팻말 없는 죽음도 아니고 그저 보호자의 슬픔을 애도하는 죽음도 아닐 터.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이의 죽음이 그 자체로 슬픔일 리도 없는 노릇인데.
의사는 죽음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 이들의 죽음을 온통 머리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환자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느낀 슬픔은 머리에 잔뜩 이고 있던 죽음을 환자에게 건넬 수밖에 없어서 떠오른 슬픔일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병실에서 당신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밀려오는 자책일 것이다. 머리에 이고 있는 죽음의 무게가 덜컥 가벼워진 것은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던가.
매일 아침 죽음이 늘어진 병실마다 죽음을 거두어 들쳐 메는 것이 교수님의 업이었고, 들끓는 죽음을 마지못해 건네 환자가 숨 거두게 되는 순간이 교수님의 슬픔이었을 것이다.
#3.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교수님은 어젯밤 그 환자에 대한 사망선고를 마치고 옆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병실에는 췌장암 말기의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가 교수님께 호소한 증상은 단 한 가지뿐. “이제 나 좀 하늘나라로 보내줘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고 있음에도 통증이 극심하여 어서 하늘나라로 보내 달라 읍소하였고 아들딸들에게 너희도 같이 사정하라고 하셨다. 아들딸들은 저들 아버지의 고통에 눈물지으면서도 그 말은 못 들은 체하며 교수님과 치료방침에 대해 논했다.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교수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다음 병실로 향했다.
삶이란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했다. 또 아름다운 것이란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애써 잡으려 해도 잘 잡히지 않고 그것을 잡으러 용쓰며 움직이는 내 모습 또한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비가 그러했고 나비를 잡으려는 아이의 모습이 그러했다. 사랑이 그러했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다. 아침이 열개(裂開)한 여백을 채워가는 생(生)의 역동(逆動)이 그러했다.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하지 않았는가. 개똥밭에 굴러도 어찌저찌 살아나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고도 삶이 아름답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글쎄, 하늘나라로 보내달라는 환자는 진실로 삶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 죽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고통의 종결책으로 하릴없이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것일 테다. 담싹 물어 삼킨 그의 입술에는 죽음을 향한 다짐과 함께 두려움이 맺혀있었기에. 이런 이들에게 손 내미는 법은 죽음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어 살고 싶게끔 하는 것. 교수님께선 머리가 가득 차 고통을 더 이상 덜어줄 수 없지만 차마 죽음을 내어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토록 쓰디썼던 것일지도.
교수님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 아니었다. 아스라진 생(生) 역시 죽음 못지않게 교수님의 머리를 두들기고 있었다.
#4 낮은 고도의 태양 아래, 안개꽃을 머리에 이고
“아까 본 췌장암 말기 환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회진이 마무리될 무렵 교수님께 여쭸다. 교수님께서는 현재로는 더 이상 고통을 줄여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물론 아직까지 완치할 방법도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너희 몫이고 부디 좋은 의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 고민해 달라 했다.
나지막한 그 한마디가 귓바퀴에서 숨죽여 고함쳤다. 좋은 의사라 하면 아름다운 의사가 되면 될 터이고 아름다운 것이란 움직이는 것 일 진대, 나는 흰 가운을 입고 의사처럼 병동을 거닐면서도 죽음에 슬픔을 매달던 시절마냥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앉은 풍경에서 죽음은 슬픔을 매단 채 부유했지만 어느 죽음도 머리 위로 내려앉지 않았다.
납작하게 인쇄된 글자만을 올려놓은 머리는 얼마나 가벼웠던가. 쉬이 내뱉었던 진단명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던가. 시퍼렇게, 시뻘겋게 멍든 검사 값들은 고작 높거나 낮은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 하얗게 잿더미로 바스라진 흉부는 그저 증가음영의 폐 침윤이 아니었을 건데. 이날부터 생(生)과 사(死)는 고집스레 내 머리 위에 서있었다.
나는 머리가 무거워진 채 아름다워지기로 했다. 현재로는 손 내밀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찾으려고 기를 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죽고 싶은 환자를 살고 싶게끔 만드는 것. 살고 싶은 환자에게는 죽음을 내어주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 팻말 없는 죽음도, 슬픔이 슬픈 죽음과 죽음이 슬픈 죽음도 아닌 ‘건넬 수밖에 없는 죽음’이 슬퍼서 힘껏 여백을 채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의사로의 역동(逆動)이며 이런 것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안개꽃의 꽃말은 죽음이라 했고 실타래는 햇빛이 닿으면 변색된다 했다. 흰 가운을 입고 걸은 걸음이 아직 몇 걸음 되지 않기에 열없는 보폭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갈변되지 않도록 이른 아침부터 문을 나서며, 하얗게 가느다란 선처럼 병원으로 향한다.
태양이 낮은 고도로 비출 때, 안개꽃을 듬뿍 머리에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