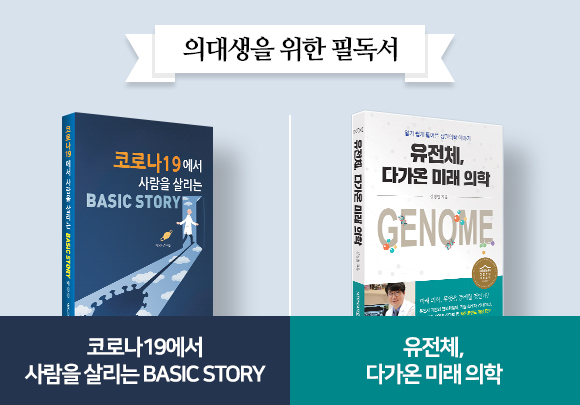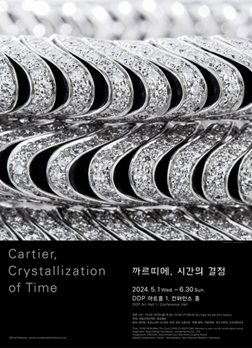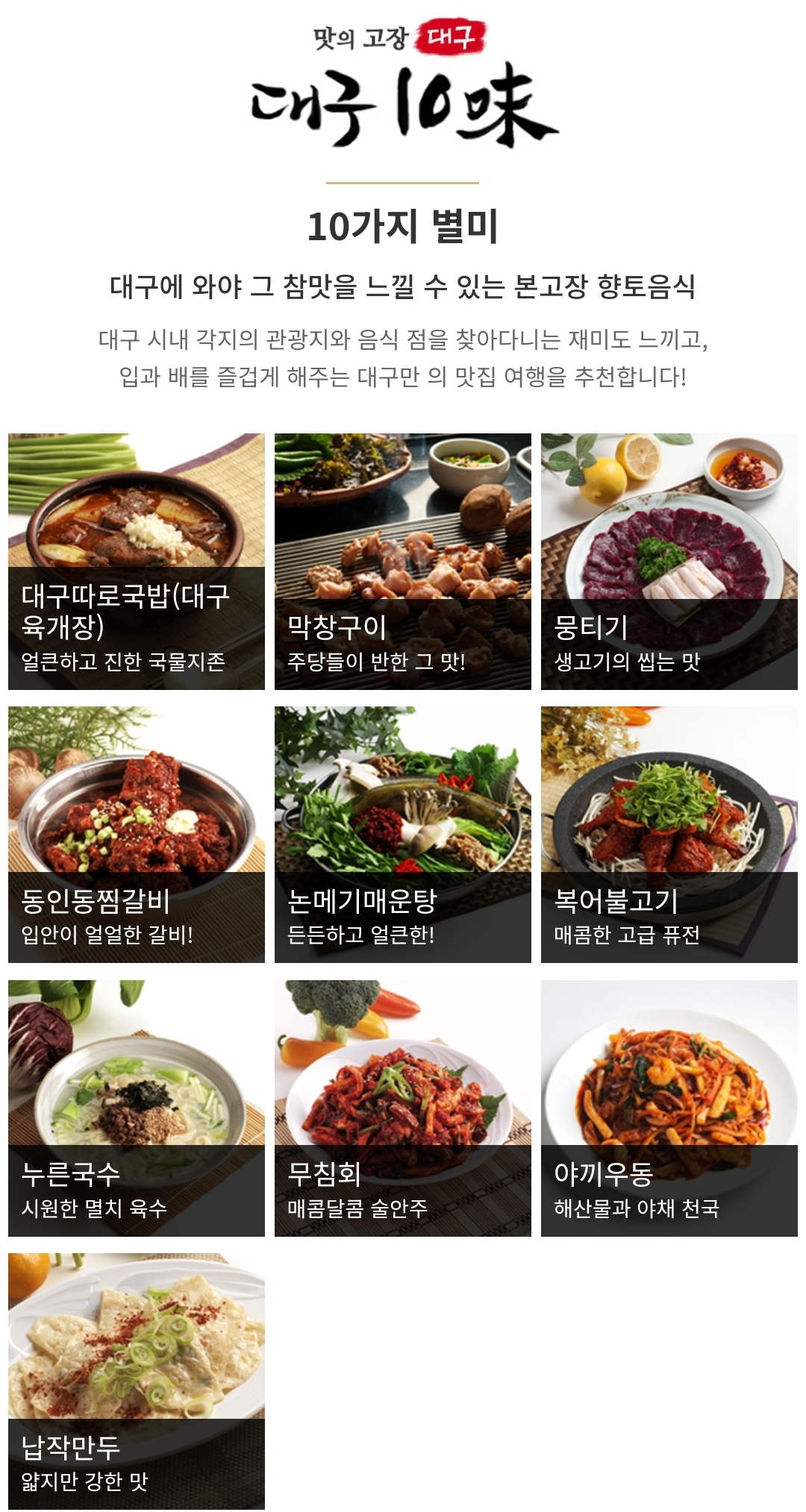1986년에서 1991년 사이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무기수 이춘재로 밝혀졌다. 이춘재는 용의자 특정 이후 한동안 범행을 부정했지만 지난 10월 1일, 처음으로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 범인을 잡는 데 공헌한 DNA 검사와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B형으로 알고 있었던 용의자, 잡고 보니 O형?
범죄 현장에 용의자의 혈흔이 남지 않더라도 침, 위액, 땀, 정액 등의 체액이 남아있다면 이는 혈액형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ABH 항원은 적혈구 외에도 혈소판, 혈관내피세포, 그리고 여러 고형 장기의 조직에도 분포하기 때문에 체액에 녹아있는 수용성 항원을 조사해 혈액형을 알아낼 수 있다. 청주 처제 살인 사건에서 채취한 정액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의자가 A형 또는 O형이라고 특정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인 상황에서 B형 항원이 따로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범인 이춘재를 잡는 데에는 DNA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DNA 검사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검사와는 다르다. 이 둘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전자 검사는 유전 질환을 비롯한 유전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이고 DNA 프로필 검사로 특정되는 DNA 검사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검사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과 정상적인 염기 서열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DNA 프로필 검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자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신 DNA 검사는 VNTR(Variable number tandem repeat)에 주목한다. VNTR은 별 의미 없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부분으로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개인 간의 변이가 매우 다양하여 ‘DNA 지문’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특정한 염기서열만을 찾아 잘라내는 효소인 제한효소로 처리하면 사람마다 잘리는 부분이 달라 다양한 길이와 개수의 DNA 조각들이 생긴다. DNA 조각들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DNA 프로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정 후 체내에서 약 72시간이 경과하면 정자의 DNA는 완전히 분해된다. 범죄 현장에서 정액이 검출되더라도 DNA 프로필을 통해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얼룩에서 얻어낸 DNA 프로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혈액형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DNA 검사로 확정한 범인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혈액형 검사 결과인 B형과는 맞지 않았다. 당시의 열악했던 혈액형 검사 기법이나 옛 자료의 기재 오류 등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강필원 국과수 법유전자과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분비물이 섞이는 등의 이유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혈액형이 원래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규 전 국과수 유전자분석과장은 강 법유전과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이었던 9차 사건에서의 검사 결과가 B형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최상규 과장은 9차 사건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교복에서 채취한 정액에서 모두 B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문을 표했다.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묻어있던 정액의 검사 결과가 전부 잘못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최 유전자분석과장의 말에 의하면 공범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한다.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을까? 프로파일러와 라포(rapport)
처음 범행이 밝혀졌을 때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8차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프로파일러가 범죄자를 심문하는 방법이 알려져서는 안 되기에 범인과 프로파일러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된 만큼의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으나,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 데는 DNA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외에도 이 씨가 노리던 가석방이 불가능해졌다는 압력을 주는 반면, 라포 형성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했던 것이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
실제로 이춘재는 강제성이 없는 면담에도 꼬박꼬박 출석했다고 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에 대해 이춘재가 정말 사이코패스라면 “면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욕망을 프로파일러들이 파악해 “계속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담에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일화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들은 이 씨에게 ‘식사는 하셨냐’,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느냐’ 등의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한 라포의 형성이 30년 간 숨겨온 비밀에 대한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이시연 기자 / 울산
<gabe10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