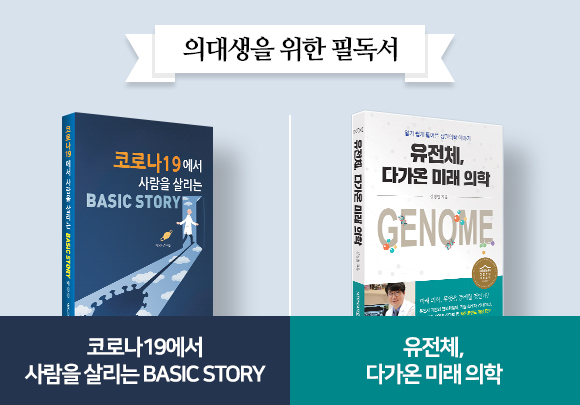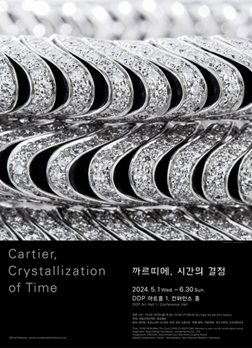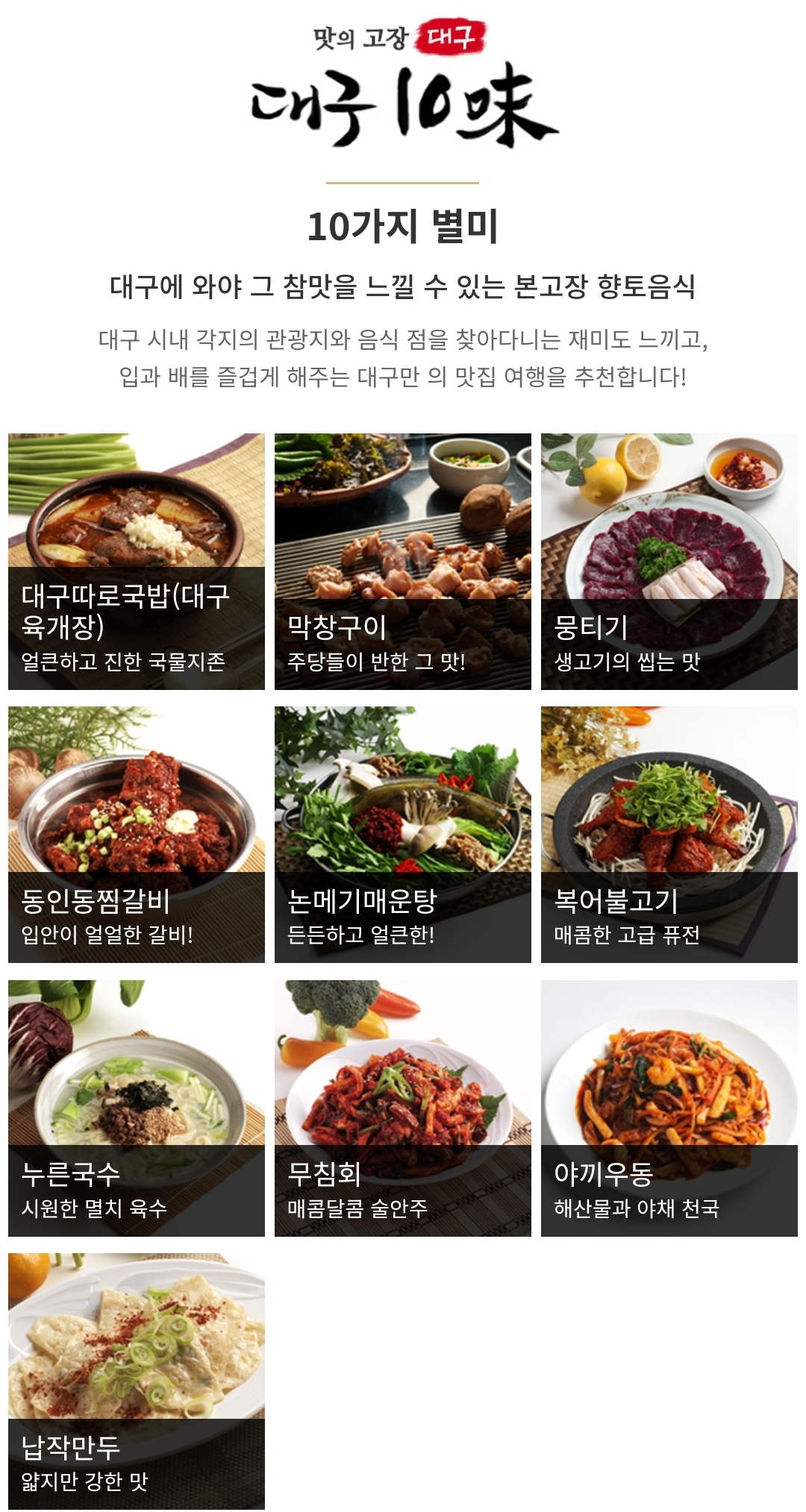지난 학기 필자는 체코 프라하에 교환 학생으로 있는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유럽을 여행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6개월을 보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은 터이기도 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유명한 곳이지만 큰 기대에 비해 실망이 컸던 적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로마가 그랬다. 필자가 겪은 로마는 생각보다 더럽고, 위험하고, 복작한 곳이었다. 그에 반해 별 기대없이 갔다가 뜻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데, 런던 여행이 필자에겐 그러했다.
맛없는 음식과 흐린 날씨가 연상되는 런던 여행은 처음에는 그리 흥미롭지 않았다. 과거와 현대를 잇는 또 다른 대도시인 서울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유사한 역사를 가진 런던은 그다지 색다른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도시를 아우르는 왕실의 문화와 산물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히 시기상 엘리자베스 2세의 시기가 막을 내리고, 찰스 3세가 즉위하는 시점에 런던에 있다 보니 왕실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에 서 있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런던의 살아있는 역사를 여행하고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런던의 랜드마크 빅 벤, 그곳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맞은편 템스 강변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The National Covid Memorial Wall’. 2021년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단체의 주도로 조성된 약 500m 길이의 이 벽에는 무려 22만개가 넘는 붉은 하트가 있다. 벽에 그려진 하트들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려진 것이며 각 하트는 영국에서 코로나 19로 사망한 이들을 상징한다.
이 벽을 조성하게 된 계기 중에는 사망자가 통계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는 하트 안에 사람들이 짧은 메시지를 남김에 따라 각각이 개별화되어 스토리를 가지며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그러하고 조성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 추모의 벽은 여행 일정에 있었던 곳도 아니고, 런던 시내투어를 따라가며 포토 스팟으로 소개받아 우연히 방문하게 된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고 돌아서 벽을 보고 든 생각들이 오히려 뇌리에 박혔던 듯하다. 이는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다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잊고 살았던, 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낳은 많은 인적, 사회적 피해들에 대해 회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찰의 마음이 들어 여전히 그 벽에 대한 인상이 짙게 남아있다.
김민서 기자/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