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본과2학년 유은주
인생, 그리고 여름
빨간 장미가 고개를 내밀고 당연하다는 듯이 여름이 다가온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짧아지고, 더운 바람이 콧속깊이 들어온다. 그에 여름 너는 신이 난 듯 더 빠르고, 가열차게 나에게로 달려온다. 요로계 시험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아침, 세시간밖에 자지 못한 나는 후덥지근하고, 불길한 기운에 눈을 떴다. 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몸속에서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은 언젠가 느꼈던 생각들인데……. 나는 침대에 누워 조금 뒤척이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과거에 잠기기 시작했다.
4년 전 여름, 간호사 3년차로 일이 익숙하고 지루해질 즈음이었다. 매미가 울어대는 느지막한 오후, 밤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맞추어놓은 시간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유난히도 불길한 기운인지, 더워서인지 모를 불쾌감들이 나를 가득 감쌌다. 바로 내가 데자뷔처럼 보았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이에 나는 그 날의 기분 나쁜 예감에 떠밀렸는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이끌렸는지 한 시간인지 한 시간 반인지 일찍 병원을 향했다. 시원한 병원 밑 로비에 앉아서 괜스레 빈 병상을 볼 수 있는 어플을 계속 새로 고침하며 오늘 맡을 내 환자들이 경한 환자이길, 내가 느낀 이 불길한 느낌들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랐다.
왜인지 모를 무거운 걸음으로 중환자실을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스테이션으로 나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훑어본 내 환자 중 하나는 출혈지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혈변과, 토혈을 계속하고 있었다. 심실 세동이 계속 일어나고, 아무리 수혈해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오르지 않는 혈압은 뚝뚝 떨어지는 말 그대로 소위 죽음이 드리워진 환자였고, 나의 불길한 예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바쁜 하루를 예고하고 있었다. ‘아. 오늘도 빨리 퇴근하긴 글렀네.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는 환자의 하얀 얼굴보다는 걱정만이 내면의 불안감을 가득 채웠다.
환자의 곁에는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 오신 임상교수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빳빳한 흰 가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냉철함이 묻어있는 표정이었다.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교수님은 환자 옆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환자의 모니터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유선생님! 아까 오더내린 피 언제 달아줄 수 있어요? 전해질 수치 나오면 바로 이상한 것 알려주세요.” 난 일하는 그 날 10시간 내내 정신없이 뛰어 다녀야 했다.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은 지독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주치의 선생님 또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임상교수님은 그 검은 밤, 환자 옆에 앉아 그 10시간 내내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위해 끊임없는 오더를 내렸다.
슬프게도 환자의 얼굴은 간절한 교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잿빛이 되어갔고, 결국 느리지만 규칙적이던 심전도는 아무렇게나 넝마처럼 흔들려댔다. 새벽 4시경, 모든 인턴들과, 내과선생님들은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고, 15분정도 지나 보호자가 멈추어달라고 할 때까지 그 격렬하고도 슬픈 행동은 지속되었다. 새벽 다섯시쯤엔 내손에 사망진단서가 들려져있었고, 환자는 잿빛의 모양새가 되었다.
내가 그 많은 죽음에 익숙해져 별거 아닌 듯 ‘아.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라고 느끼며 그 환자의 사망 후 정리를 하려고 하이얀 커튼을 걷으며 고개를 넣은 순간 환자옆에 앉아있던 교수님께서 이미 창백해진, 핏기가 하나 없는 손을 잡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밖에는 너무 더워요. 이곳은 춥죠? 하지만 나는 바깥 더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단 하룻밤이지만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셨네요. 같이 계속 우리가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젠 가시는 발걸음 함께 걸을 수 없어도, 먼저 좋은 곳에 가계시길 바랍니다. 저도 늦게 지만 곧 따라 가겠습니다.” 그날 내가 본 그것은 그 냉철한 얼굴에서 나온 따듯한 눈빛과 함께, 날카로운 입에서 나온 세상 누구보다도 마음 간절한, 그리고 사랑이 담긴 레퀴엠이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하루를 지낸 후 햇볕이 쏟아지기 시작한 퇴근길에 출근할 때 앉았던 병원로비에 다시 앉아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갔다. 그 속에 섞여 그 날 밤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하루를 곰씹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있던 내가 지옥같던 하루 끝의 교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며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짧은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인 끝 무렵의 겨울을 같이 걸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 안에서의 그 하루는 너무 소중하고, 힘들고, 그들에게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계절 속에 같이 서서 더 풍부하게 해주기도, 늘려주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그 교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짧은 겨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의사가 되어 환자들의 계절에 함께 서서 많은 것들을 헤쳐 나가고 더 숲을 우거지게도, 조금 더 눈 오는 겨울밤을 느낄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인생의 한 여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단편적인 겨울 또는 여름일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사계의 일부분을 내 인생 안에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날, 그 느낌, 그 생각들이 내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첫 이유였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어 인생의 무엇을 하던지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바로 지금 본과 2학년,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교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앞으로 많은 사람의 사계를 접하고 같이 걸어갈 생각에 그 힘든 공부도, 나이 30이 되어 겪는 학교생활도 즐겁고 설레기만 하다. 모든 이들의 짧은 부분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만날 수많은 환자들과 의미 있게 손잡고 그들의 겨울을 아니면 사계의 일부분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눈싸움을 하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걸어가다가 보면 내 인생의 여름, 가을, 겨울은 많은 사람의 인생들의 조각조각으로 무지개빛처럼 채워지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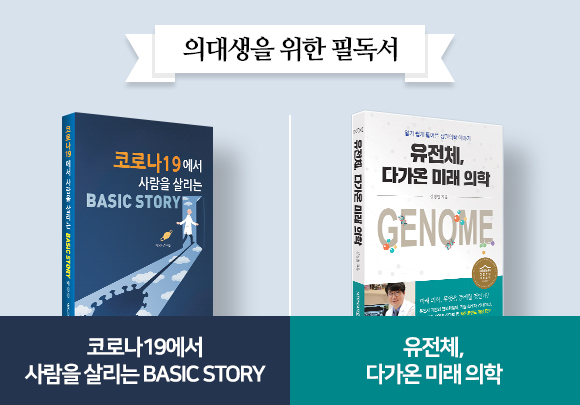
![5년 – 제7회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수상작 [대상]](http://e-mednews.org/wp-content/plugins/theplus_elementor_addon/assets/images/placeholder-gri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