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 서울대학교 본과 4학년 최세진
오늘, 나는 반짝이는 빛을 쫓는다
소식을 들은 건, 이제 막 시작되는 여름을 알리듯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단어를 믿을 수 없어, 우두커니 서서 내리는 비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레지던트인, “가까운” 친구의 백혈병 소식은 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짐짓 무덤덤한 친구의 메시지에 빠른 회복을 바란다는 답변을 가까스로 보내긴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무엇보다 나를 압도했던 건 ‘성우…이제…죽는건가?’ 라는 생각이었다. 분명 2학년 혈액학 시간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생존율, 치료법, 재발 확률, 발병 원인 등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인 나는 의학지식보다 친한 친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했다.
로라 옆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간 실습을 나온 뉴욕의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만난 그녀는 47세, 아직은 젊은 나이의 흑인 아주머니였다. 연수막전이가 동반된 부인암 4기를 판정 받고,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 소실로 중환자실에 왔다.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고 의식을 회복한 로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의사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라고 느낀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로라는 곧 다시 극심한 고통 속에 던져 졌고, 종양내과는 남은 시간이 한 달이 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완화의료팀이 왔지만, 제안할 수 있는 최선은 뇌실외배액관을 머리에 단 채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그녀의 남편과 이제서야 엄마의 병에 대해 알게 되어 중환자실 복도에서 숨죽여 우는 21살 큰 딸은 회피하고 싶은 비극 속 한 장면이었다.
죽음을, 고통을, 그 가족들의 아픔을 목격할 때, 나는 미숙하게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병원에서 실습하며, 항암치료를 받는 친구에게 누구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하고 싶었다. 혹시나 경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 로라에겐, 특별히 제안할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하기 싫었다. 반면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일한 선생님들은 환자가 들어올 때 이미 누가 죽을지 보인다고 한다. 숙련된 의사에게 죽음은 뇌사 판정기준 속의 체크리스트로 환원 되어야 하는 존재인 듯 보였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의사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편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 아직 죽음은 일상이라기보단 사건이었다.
기도삽관 제거 후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로 “I want to fight this.” 라고 말하는 로라의 말을 들었을 때,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다. 통증으로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들어하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딸을 위해서 이 병과 싸우고 싶다는 그녀의 치열함이 전해졌을 때, 놓치고 있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의무기록으로 담지 못하는 로라의 모습들이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라는 신경학적 검진을 할 때마다, 나를 웃게 했던 로라의 주황색 매니큐어. 로라의 사진을 모아 붙인 선물 속의 아름다운 미소와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녀의 모습. 문진하는 내용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유쾌하게 대답하던 모습… 거기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말하는 ‘수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느끼는, 일상 속의 반짝거리는 웃음과 기쁨이 있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작지만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었다. 용기를 내어, 투병하는 성우에게 동문회 후배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그 반짝거림이 있었다. 창피 하기만 했던, 이제는 잊지못할 추억이 된 형광 주황색 고등학교 체육복 바지를 인형에 입혀서 가져갔을 때였다. 분명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따스함을 느꼈다.
난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은 의사가 아닌, ‘학생의사’이기에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했다. 또는 ‘친구’이기에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라는 내게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선택지가 아니라, ‘의사’로서 선택 가능하고, 선택이 기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병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환자 자신의 몫이지만, 든든한 후방부대의 역할은 의료진에게 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deux ex machina)를 바라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지만, 그 의학 지식이 환자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것을 막진 못한다. 철저한 책임의식을 망각하지 않으면서도 환자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줄 소소한 유머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시간낭비라기엔 너무 소중하며, 현실성 없다고 하기엔 훈련 가능하다.
의사는 죽음까지 정확히 어느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말해주지 못한다. 의학지식 속 통계와 확률로 점철되는 숫자들은 공허하다. 동시에, 스타트렉 속 벌칸 족처럼 머리에 손을 대어 사람의 과거와 감정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환자의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해 공감하고 위로해주겠다는 것은 오만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온기, 용기, 그리고 반짝거리는 이 빛은 성별, 인종, 친분을 달리 하지 않는다. 그 누구든 죽음이라는 문을 열 때까지, 내딛는 발 바로 앞을 비추는 빛이다.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또는 죽음에 대한 무의미한 일상화가 의료인을 덮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빛이다.
오늘, 나는 이 반짝이는 빛을 쫓는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가명임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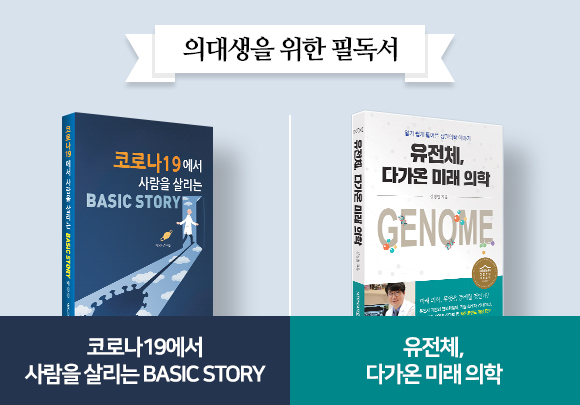
![5년 – 제7회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수상작 [대상]](http://e-mednews.org/wp-content/plugins/theplus_elementor_addon/assets/images/placeholder-gri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