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
:: 한양대학교 의학과 1학년 백동우
<1989 종이배>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조롭지만 달콤했던 방학의 막바지에 서울 외곽에 있는 제법 큰 어린이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음료수 쿠폰 한 장과 앞치마를 받고 도착한 곳은 남아 입원병동. 사람 목소리라기에는 이질적인, 우리 집 뒷산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시원하고 평온한 병동을 가득 메워 병원 특유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덮었다. 유독 맑은 8월의 날씨를 투영하는 커다란 창문 아래에는 여러 명의 말이 없는 환우들이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조심스런 손으로 침대 레일을 닦으며 한명씩 유심히 들여다보니, 1학기 때 배운 해부학을 모조리 무시하듯, 뼈와 근육들은 조율이 안 된 기타의 소리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서로의 음을 향해 날카롭게 눈을 흘기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한 환우의 인적사항이 적힌 카드에서 그 단어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한 번 쑥 훑고 지나는 듯한 울렁거림을 느꼈다.
‘1989년’ 입원일자였다. 어린이 병원에는 어린 친구들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깨짐과 동시에 그의 턱에 자란 수염이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글자가 새긴 잉크가 머리로 들어와 스미는 듯 한 느낌은 지나가고, 28년이라는 압축된 시간이 무겁고 둔탁한 무게추가 되어 내 마음을 서서히 짓누른다.
30년에 가까운 침대에서의 생활과 바깥의 활력이 넘치는 한여름의 공기의 순환은 묘하게 섞여 촉매작용을 일으키듯 초등학교 운동장을 연상시켰다. 그리고는 물로켓. 과학실에서 칠성사이다 두 병과 문방구에서 파는 킷트를 조물거리며 유난히 맛있었던 급식을 먹고 쏘아올린 물로켓. 나와 친구들이 물로켓과 자신만의 응어리이자 누군가의 꿈을, 불규칙적인 물줄기를 당차게 뒤로하고 한 아름 쏘아 올릴 때, 이 친구는 하얀 천장으로 무엇을 쏘아 올렸을까? 고등학교 운동장에 처음 깔린 잔디에 누워 별을 보던 기억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처음 여자 친구와 손을 잡은 기억으로 급류를 탄 종이배처럼 내 기억은 가장 화창했던 여름날들을 수직적으로 스친다. 다채롭고 입체적인 나의 추억들이, 당신 옆에서 초록색 선으로 질주하는 EKG의 세그먼트를 닮았을 28년의 의식의 흐름과 이질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나를 고개를 숙이는 법을 잊은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의 종이배가 방방곡곡을 누비며 관계를 맺고 뚝딱뚝딱 판자배가 되었을 적에, 당신의 배는 아주 평온한 침대위에서 때때로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으며 흐르지 않는 시간을 견뎌냈을 것이다. 내가 할애 받아 흘려보낸 23년의 시간 중에 단 1년도 그가 누운 자그마한 침대와 한 평의 천장에 넣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 28년이라니. 방을 메운 호흡소리는 새벽을 지나 정오가 된, 작은 개울의 울음소리와 유사하게 내가 모르는 새에 견디기 힘들만큼 커져 있었고, 마음이 한없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다.
대학에 들어온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20대 초반을 건넜다. 주위에는 젊고 멋진 친구들이 함께했고, 좋은 학문을 접했으며, 나름의 풍족한 자유를 누렸다. 더군다나 작년에 수서동의 좋은 집으로 이사하여 본의 아니게 내 환경은 더욱 윤택해졌다. 나는 한 마리의 꿩처럼 비슷비슷한 무리에 둘러싸여 응시하는 쪽의 세상의 단면만이 전부인 듯 인식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학생활을 했다. 조금은 불편한 세상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온 이유로, 슬그머니 고개를 고정시켰으므로 난 꿩보다는 악질이다. 우리는 아무도 아픔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나는 유럽여행을 가는 동기들을 부러워했다. 아마 내가 28세의 환우에게서 희망이나 인내와 같은 것을 포착하기에 앞서 우울한 상념에 잠긴 까닭은 나의 이런 편협함과 왜곡된 편의에의 적응에 있었으리라. 내가 의학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울감에 젖거나 인간으로써 자기반성을 하는 데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의학을 배워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줘야 한다는 고귀한 꿈을 바깥에만 내걸고, 나만의 행복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하며 달의 반대편에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차가운 세상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28살의 환우에게 극도의 미안함을 느낀 것이다. 새내기 때 들은 교양 수업에서 배운 오멜라스라는 마을에 갇힌 어린이를 잊어버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의대생으로써의 나의 모습이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아주 우연히 오멜라스의 지하실 문이 열렸으며 그 순간부터 달은 반대로 자전이라도 하듯 이면을 비추었고, 나는 내가 조종한 쇼에 수많은 혹평을 받은 연극 감독처럼 부끄러움에 떨어야만 했다.
이사한 새 아파트는 한 방향으로는 사람들과 기계가 합주하는 도심의 소리가, 또 한 방향으로는 대모산에서 들려오는 온갖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다. 그래서인지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걸맞지 않게 낮에는 꿩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린이 병동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마치 나에게 아픔을 마주하라는 듯이 밤마다 개구리들이 잠이 든 꿩에게 아주 아우성이다.
‘너는 아픔이 깃든 그 누군가의 아름다운 여정에 어울리는 노를 깎을 수 있겠는가?’
+++소감+++
저도 역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뉴스를 접하면서 나름대로의 다른 상상을 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그냥 시간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겼고 이들은 어딘가에 먼지처럼 쌓였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는 다른 일들에 신경을 잘 못쓰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본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좋은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 본 어른 환우의 모습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침상에서의 28년의 시간이 정말 저를 파도처럼 덮치는 듯 했습니다. 처음 카데바를 보았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솟구쳤고 병원 구석에서 주문받은 카테터를 멍하니 정리하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느낌만큼은 글로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쓴 지 오래 되어서인지 내가 느낀 그 감정 전체를 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느끼지 못한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개강을 하기 전 주말에 글을 쓰면서 그동안 쌓인 먼지들과 또 앞으로 쌓일 귀한 먼지들을 위해 청소를 하는 느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골격계 시험 바로 전날 저녁에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은 것 같아 그 어느 상을 받았을 때보다 고맙고 기쁩니다. 글솜씨가 부족한 저의 울퉁불퉁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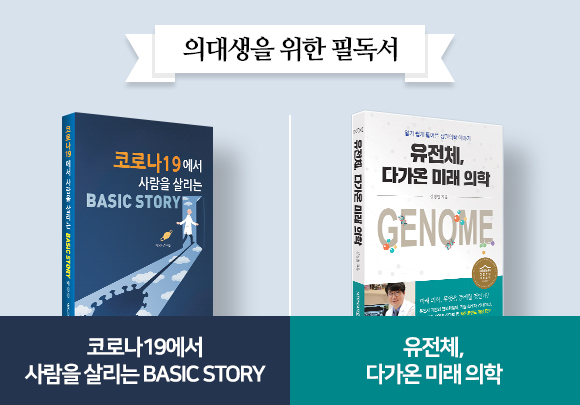
![5년 – 제7회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수상작 [대상]](http://e-mednews.org/wp-content/plugins/theplus_elementor_addon/assets/images/placeholder-gri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