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한양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박현진
5년
아버지는 광부였다. 소작농으로 살기 싫어 집을 뛰쳐나간 당신은 죽음이 반딧불처럼 맴돌던 강원도 탄광의 갱도 끝을 헤매다 서른여섯에 누나를 얻고 이듬해 나를 얻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새빨갛게 타오르는 두 산의 골짜기 사이를 크게 건너뛰는 꿈을 꾸고 얻은 나는 소작농의 아들인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태몽처럼 불타는 세상에서, 그러나 태몽과 달리 쉬이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던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서른이 넘어서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들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어떤 믿음에서였을까.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종이에 베인 것처럼 가슴 한복판이 아파 온다. 지난 4월 숨이 가빠서 동네 병원을 찾은 그의 흉부 방사선 사진은 오른쪽 흉강 아래가 온통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흉관을 박아 빼낸 흉수 안의 세포를 검사한 동네 병원에서는 당장 큰 병원을 찾으라 했다.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아버지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소아과 실습을 돌고 있었다. 별 일이야 있겠나. 아무런 근거 없이 괜찮을 거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다. 그새 흉수는 빠른 속도로 차올라 있었다.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불안을 애써 달래던 어느 날, 뜻밖에도 결과는 선암(adenocarcinoma)이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들여다보지도 않던 해리슨 내과학을 미친 듯이 찾았고, 업투데이트를 샅샅이 훑었고, ‘너 의사 되는 것도 못 보고 죽는 너네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하며 울며 전화하던 이모에게 무슨 헛소리냐고 악을 쓰던 기억들이 명멸하듯 스친다. 하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도 있다. 아직 교수님께 결과를 통보받기 전, 전자차트로 병리과 검사결과를 먼저 받아든 그날 오후의 일이다. 결핵이 맞냐는 아버지의 손을 정말 오랜만에 붙잡고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입에서 꺼냈을 때, 한참의 다짐이 무색하리만치 나는 울었다. 햇살이 나른하게 서쪽으로 비끼던 오후 두 시 반의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의사처럼 가운을 입은 나는 완치가 불가능한 전이암 환자의 무력한 보호자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매만지는 일 말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습실에서 70세 호흡기내과 환자의 차트를 훑는 소아과 실습생만큼 어색한 건 없을 테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흉강 전이가 있다기에 전이된 폐암의 생존율을 훑던 내가, 생검 전이지만 중피종(mesothelioma)이 의심된다는 말에 중피종의 최신지견을 훑던 내가 마주한 것은 어떤 그래프였다. 로마자로 I부터 IV가 쓰여 있고, 수평선이 어느 한 구간에서 일제히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 종양학에서 흔히 보아 왔던 5년 생존율 그래프였다. 수업을 들을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그 그래프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5년이라고 쓰인 x축이 생존율의 y축과 수렴하는 지점이었다. 5%. 고작 5%였다.
본디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죽음에 이르면 그때서야 기록되는 귀납적 수치다. 여명 또한 마찬가지다. 내 아버지의 폐에 생긴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방사선 사진을 뿌옇게 물들인 그 무언가가 중피종이 맞다면,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2개월에서 길어야 21개월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여명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가 꼭 그만큼 살아 있다 죽었기 때문이다. 열두 달을 꼬박 앓다가 죽어야 했을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그래프의 표면으로 뛰어올라 성큼 내 뺨을 후려친 순간, 나는 얼마나 전율했던가. 5년 생존율을 그려 둔 지그재그의 그래프는, 얼마나 소스라치는 것이었던가. 서늘할 정도로 감정 없이 그려진 그래프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오열이 묻어 있던가.
아버지는 울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을 것이다. 떨림이 가시지 않은 채로 내 등을 어루만지던 거친 손이 그것을 증명했다. 내 안에 소년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안에도 소년이 있을 것이었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었고, 꿈이 있을 것이었고, 소작농의 아들로 빈민 계급에서 살아 왔지만 어쩌면 아들이 의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것이었다. 영원히 살지 않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에 꿀 수 있었던 허망하고도 달콤한 꿈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온기, 한 줌의 포옹, 깃털 같은 입맞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던 것은 늘 사소한 것이었다. 분명히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했을, 그러나 너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 오랫동안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남긴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길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첫 두 번의 화학치료에 반응이 없어 약제를 바꾼 뒤로 머리가 빠지는 아버지에게, 매일 조금씩 숨이 가빠 온다는 아버지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으로 아버지의 치료 일정을 달력에 적으며 나는 간절히 빌었다. 아버지가 방황하던 나를 말없이 믿었던 것처럼, 때로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아빠, 있잖아요 아빠, 우리 조금만 오래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조금만, 조금만 오래요.
+++소감+++
당선 소감문 : 남은 것과 남겨진 것
새벽 두 시 반. 밤 열한 시 반에 청량리를 출발하는 열차가 고향에 도착하는 시간. 적막한 강원도의 밤을 가로질러 본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보아 왔던 풍경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축구를 보는 아버지. 반쯤 자다 깬 목소리. 왔니. 밥은. 라면 하나 먹고 자라. 끓이는 김에 하나 더 끓이든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남겨진 것들을 생각한다. 열일곱 살,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살게 된 강릉의 자취방에서 나는 매일 밤 울어야 했다.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돌아와도 반겨줄 가족이 없는 빈 집은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꽤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으므로. 그러나 내가 반쯤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온 지난 열여섯 해 동안 사실은 아버지도 나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테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것이다. 떠난 사람에게 견뎌야 할 삶이 있듯 남겨진 사람에게도 남은 삶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떠난 자리를 아버지 또한 어떻게든 견뎌야 했다는 사실을.
정말 부끄럽지만 공모 마감일에 당선작을 썼다. 아버지가 3차 화학치료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온 날이기도 하다. 원래는 산부인과 실습 때의 에피소드를 써낼 작정이었다. 마감을 네 시간 정도 남겨 두고 원고를 다듬다가, 문득 등 뒤에서 잠든 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깨닫지 못한 사이에 폭삭 늙어 버린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뭔가에 홀린 듯 새 창을 열고 글을 썼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지 않게끔 휴지를 한 주먹 물고 소리를 죽인 채 흐느끼며. 몇 시간은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소감문을 쓰기 전에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보니 40분 걸린 것으로 되어 있다. 글을 썼다기보다는 사실상 구토를 한 셈이다. 그토록 조악하게 뱉어낸 글을 교정조차 보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제출했기에, 당선 소식을 듣고 사실 많이 당혹스러웠다.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고 있을 쇠털 같은 사람들 중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누구 하나라도 알아주길 바라며 서툴게 토해 낸 글에 뜻밖의 낭보를 전해 주신 심사위원 제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전한 동료가 몇 안 되는데, 슬픔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진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스무 살 이후로 아빠에게 번번이 실망만을 안겨 드렸는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 제기랄, 매일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아빠라는 말을 쓰니까 갑자기 치받쳐서 또 눈물이 난다. 남은 삶도 남겨진 삶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할 테다. 질투 날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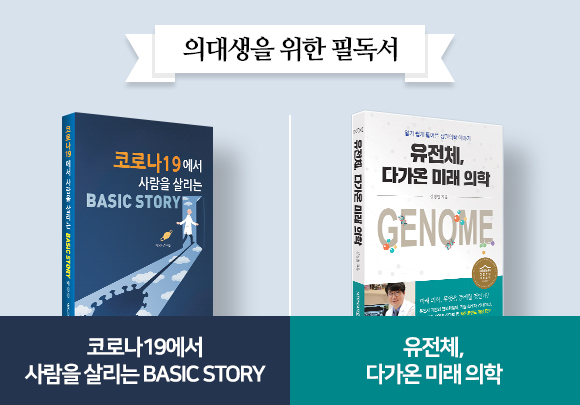
![병동에서 만난 역지사지 – 제7회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수상작 [금상]](http://e-mednews.org/wp-content/plugins/theplus_elementor_addon/assets/images/placeholder-gri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