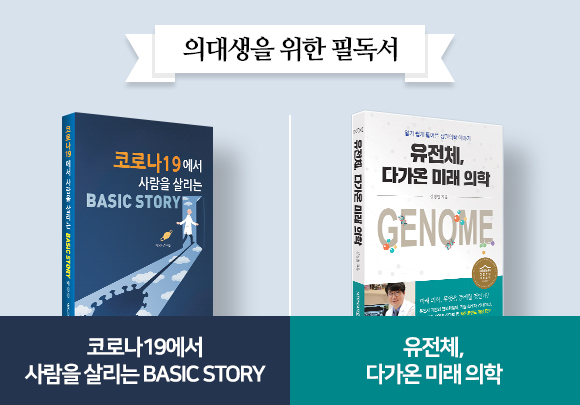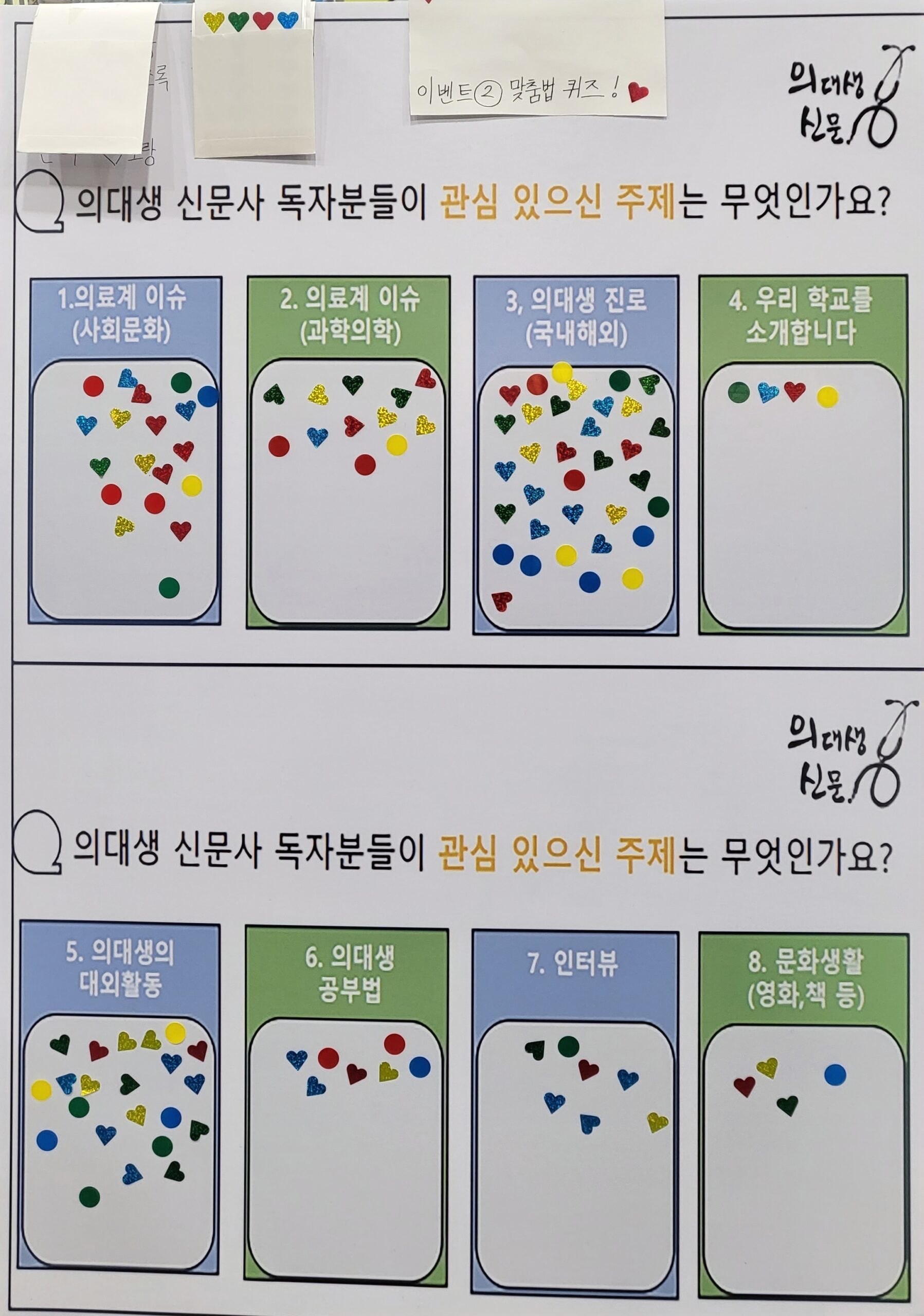예과 때 모임에 가끔 나타나는 본과 3,4학년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이 궁금했던 적이 있다. 필자와 같은 궁금증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 학생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학생의사(PK)의 일상과 실습을 돌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려 한다. 본 기사는 실습을 아직 나가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쓰였으므로, 학교마다 실습 과정의 몇몇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다.
가장 먼저, 대학은 교육이 주 목적이지만, 병원은 교육보다 환자 치료가 우선시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 강의실 내에서 다 같이 모여 수업을 듣던 생활에서 벗어나 몇 명씩(필자의 학교는 3~4명) 조를 지어 각 과를 돌게 되는데, 병원 관계자 대부분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pk에게 신경을 써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설수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지치고 힘들었던 본과 1,2학년을 끝내고 나니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루 일정은 대개 교수님을 따라 오전 회진을 도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회진을 돌게 되는데, 족보라며 줄줄 외웠던 그 문장 그대로 증상을 표현하는 환자를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case presentation에 배정된 환자가 아닌 이상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 말은 곧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오면, “죄송합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를 반복하는 pk의 모습이 독자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학기가 지날수록, 멍 때리며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과 별로, 교수님 별로 회진을 계속 돌다 보면 다양한 의사, 다양한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의사 환자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의사 상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각 과를 돌 때마다 앞에서 말한 case presentation에 관한 환자를 배정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교수님 앞에서 배정받은 환자의 진단명 및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발표하게 된다. 물론 누가 붙잡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서 열심히 만들더라도 걸어 다니는 해리슨인 교수님들 눈에는 허점투성이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고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케이스로 공부했던 질병만큼은 정말 시험 때 까먹지 않고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종종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병력 청취도 하고 신체 검진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맨 처음 환자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대개는 회진 때보다 학생 의사가 혼자 찾아갔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졸업하고 정신없이 일하게 되면 환자분들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쉬운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연습을 해두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틀은 위와 같지만 결국 실습 생활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같다. 기사의 작성 취지 상 적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학업 외에 큰 뜻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도 있다. 많은 의대생이 그렇듯 필자도 본과가 되고 나서야 예과의 소중함을 알고 후회를 했었는데, 독자들이 다가올 제 2의 예과, pk 실습을 어떠한 방향으로든 알차게 보내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현규 기자 / 한림
<wldrjad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