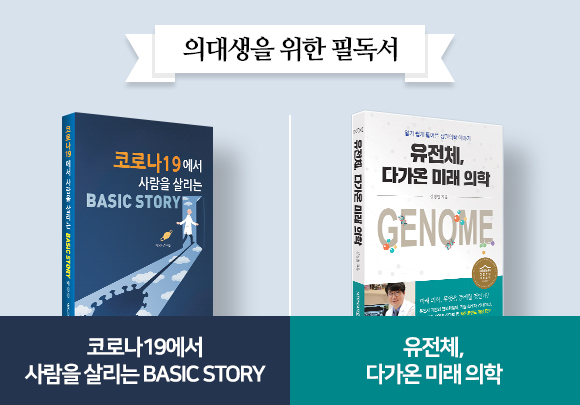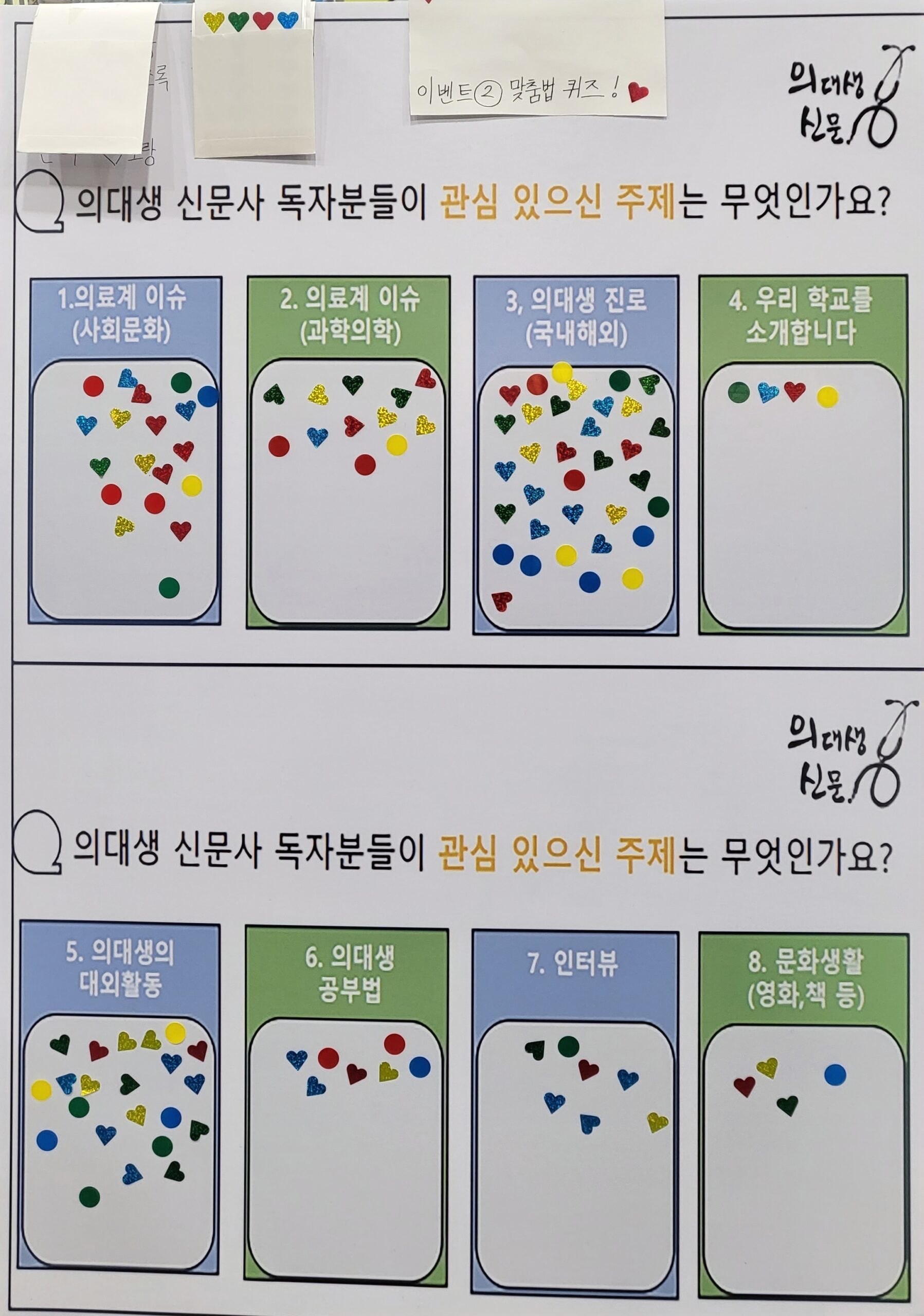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마치고 내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남쪽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작은 도시 지와이(Ziway). 지와이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다시 20km 여의 험한 비포장 흙길을 달려 겨우 도착한 불불라(Bulbula) 지역. 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그 오지를 며칠간 다녀 왔다.
의대생으로서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해외의료봉사’, 부푼 기대를 안고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 열흘간의 봉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점을 배우고 경험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개선이 필요한 안타까운 단면도 적지 않다. 특히 한 환자라도 더 돌보려 애썼던 의료진과 봉사단의 열정에 비해, 단기해외의료봉사 시스템에서의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본 글에서는 기자가 경험한 단기해외의료봉사의 비판점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봉사팀이 야외에 간이병원을 설치하는 동안 환자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다.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순서가 적힌 번호표를 나눠준다. 차례가 오면 예진팀에서 주증상과 혈압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어느 진료과로 환자를 보낼지 분류(triage)한다. 크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분류하였고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팀으로 보내 영상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료과에서 병명을 진단받고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제팀을 찾았고, 우리는 진단서에 적힌 대로 약을 나눠주며 복용방법을 지도해 주었다.

아무것도 없던 풀밭에 우리는 작지만 그럴듯한 병원을 만들어냈고, 봉사는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봉사를 하며 조금씩 떠오르는 찝찝한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뜻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의 의료봉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진 어려움은 우리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설 만큼 많은 환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봉사일 동안 가능한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함인지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의 환자를 보았다. 그런데 진료과가 다양하지 않아 정신과, 안과, 피부과 등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과로 보내진 것이 문제를 키웠다. 내과 선생님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환자 한 명 당 2~3분 이상 진료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심지어 통역을 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빼앗겨 병력을 듣거나 제대로 된 신체진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어느새 우리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쫓기듯이 기계적인 진료만 하고 있었다. 의료인력뿐 아니라 의료 장비도 부족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상황은 열악했고 초음파를 제외하면 X-ray같은 영상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진료의 질은 떨어졌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가 단기의료봉사팀인 까닭에 일시적 처방과 진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현지의 보건의료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느껴졌다. 한 지역에서 진료하는 시간이 워낙 짧다보니 진단이 옳았는지,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경과를 전혀 지켜볼 수 없었다. 그리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여력이 되지 못해 일시적인 대증치료로 만족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한 달 치의 약만 주게 되는데, 이 미봉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오염된 물을 매일 마실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지사제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게다가 일단 한 번 약을 주고 돌려보낸 환자를 다시 볼 방법이 없다. 환자들은 약이 복잡하게 섞인 봉지를 받고, 두 단계의 통역을 거쳐 각각이 t.i.d인지 b.i.d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약인지 복약지도를 받는다. 이분들이 이후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지 의사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 설명해줘도 환자들이 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제공해줄 수도 없다. 환자들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의 위생 관리도 받지 못한 채 파리가 들끓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
일시적인 처방조차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환자도 많았다. 복부 종양, 백내장, 조현병처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일주일 치 비타민과 알벤다졸만 처방할 뿐이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온종일 걸어와서 몇 시간을 기다려 결국 위약(placebo)만 받은 한 가족이 떠오른다. 이를 모르고 활짝 핀 얼굴로 돌아가는 그들을 볼 때의 안타까움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또한 현지에 만연한 질병이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국에서 준비한 약제와 필요한 약제가 다른 경우를 종종 마주쳤다. 한 예로 들끓는 곤충과 부족한 위생 지식으로 인해 옴(scabies) 환자가 정말 많았는데, 봉사팀은 이를 예상하지 못해 일찍 병원에 온 적은 수의 환자들만 약을 받고 이후는 비타민만 받았다. 봉사 후반에는 그나마 있던 약들도 떨어져 남은 약들을 대강 맞춰주게 되었다.
해외의료봉사가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고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지의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성 있는 도움이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의료봉사의 목적은 봉사자들의 도덕적 충족감, 만족감을 채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봉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의료봉사 자체가 현지인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파고 진드기가 없도록 세탁한 이불을 주는 것이 일시적인 소염진통제를 나눠주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지의 의료상황을 사전조사하고 현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해외의료봉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봉사단들의 아름다운 땀과 열정이 오롯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경훈 기자 / 울산
gutdokt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