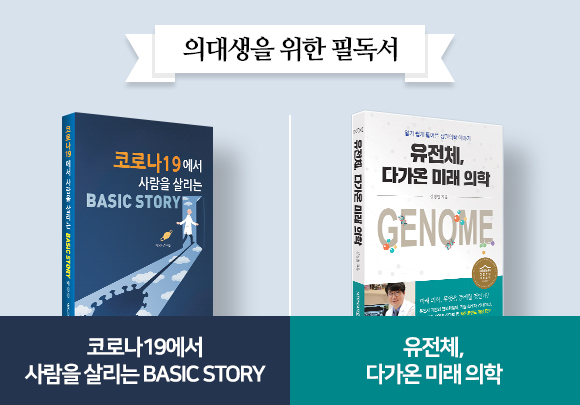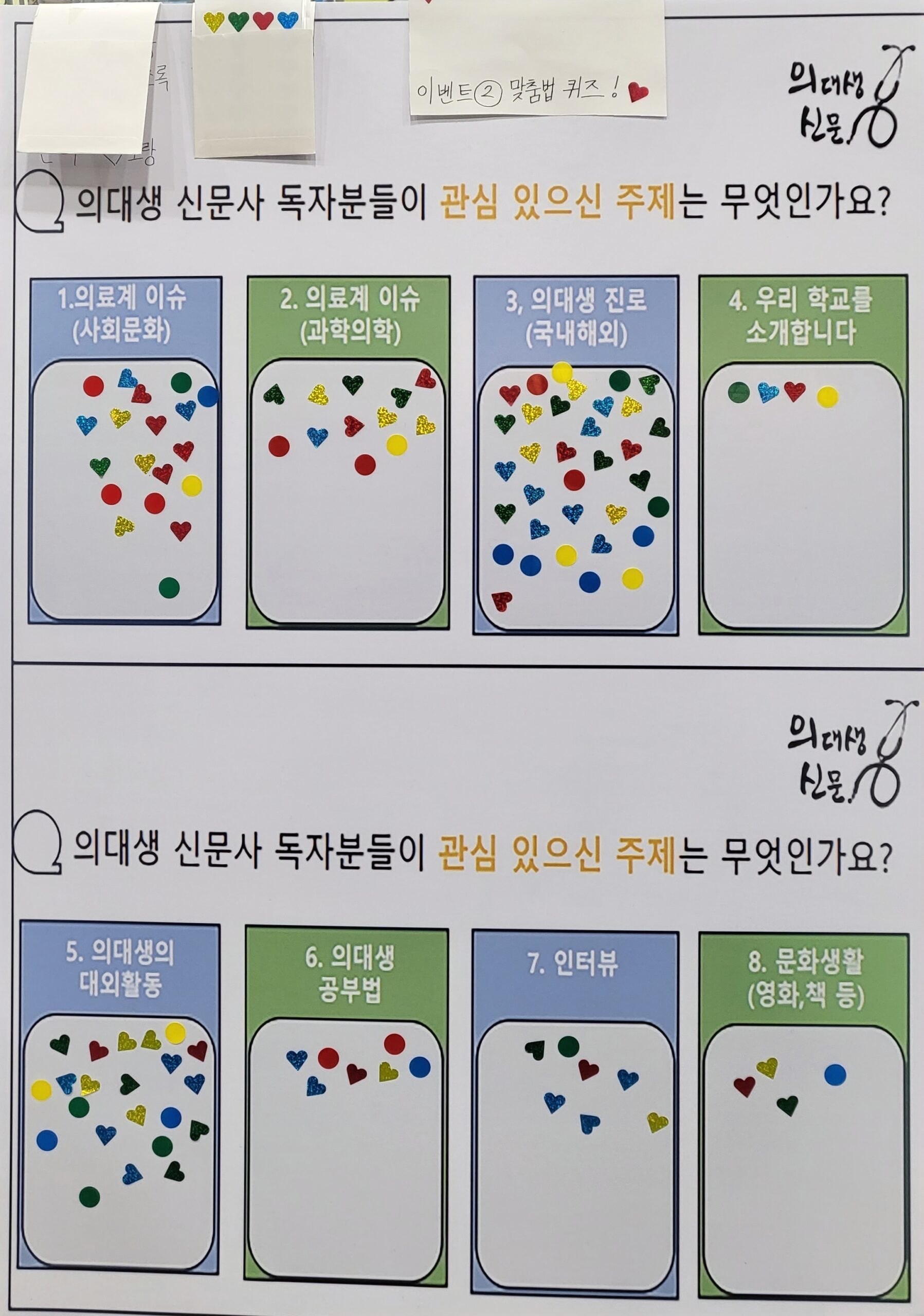생각해보면 의학은 과학 중에서 가장 인문학의 냄새를 풍길 만도 하지만, 의대생이 배우는 의학이란 학문은 그렇지 않다. 외우고 까먹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 된 의대생은 마치 ‘글자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대생에게 ‘인문학’은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엇나가는 것은 항상 즐거운 법이다. 그렇게 지루한 ‘의학공부’에서 엇나가 여러 관점으로 바라본 ‘의학’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오아시스’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금만 엇나가보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인문학을 가장 손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 ‘책’이다. 획일화된 알고리즘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인간을 치유하는 ‘낭만닥터’가 되고 싶다면 ‘올리버 색스(Oliver Sacks)’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추천한다. 이 책은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이야기이며, 저자인 올리버는 ‘의학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신경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단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는데, 책 초반에 다음 문장을 인용한다. “의사는 자연학자와는 달리 다양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론화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생명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체, 즉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에 마음을 둔다.” – 아이비 맥킨지. 올리버는 환자를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으로 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다.
‘칼 세이건’이 뇌과학에 대해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에덴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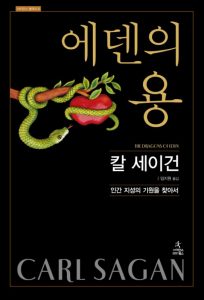
우리는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으로 ‘칼 세이건’을 알고 있지만 그가 천문학에 대한 책만을 낸 것은 아니다.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은 당시의 뇌과학에 대해 철학적 접근을 한 책이다. 우주만 바라볼 줄 알았던 칼 세이건이 ‘뇌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면 추천할 만한 책이다. 본 책은 ‘김상윤 교수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이 직접 추천해주셨다. 김상윤 교수님은 이 책을 추천해주시며,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의대공부를 하면서 교양서적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인 즐거움은 의학공부의 따분함을 눈 녹듯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내용, 이 내용들이 같이 어울릴 때에는 만족할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다면 ‘부산의사 김원장’이라는 북튜버를 추천하고 싶다. 가끔 의학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 외 여러 분야의 책들도 소개해준다. 암기에 치여 지친 하루,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하며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이진구 기자/을지
dbd05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