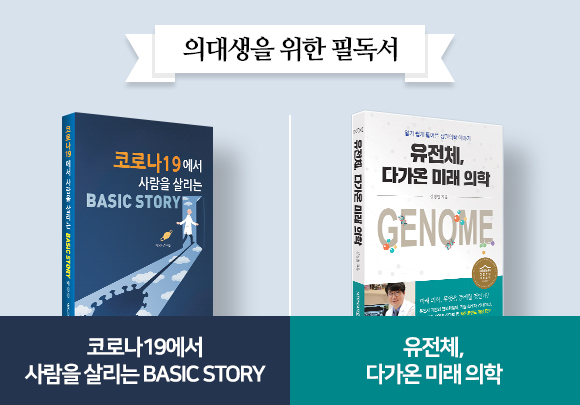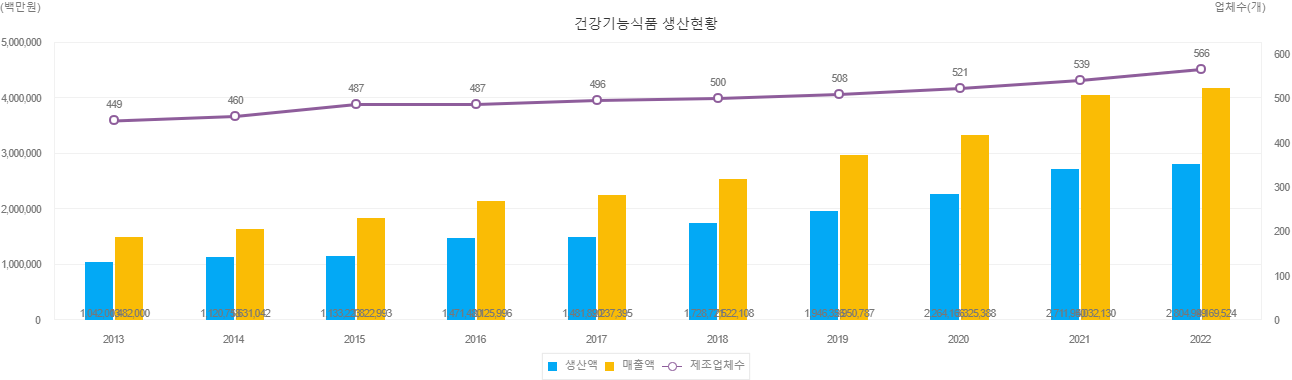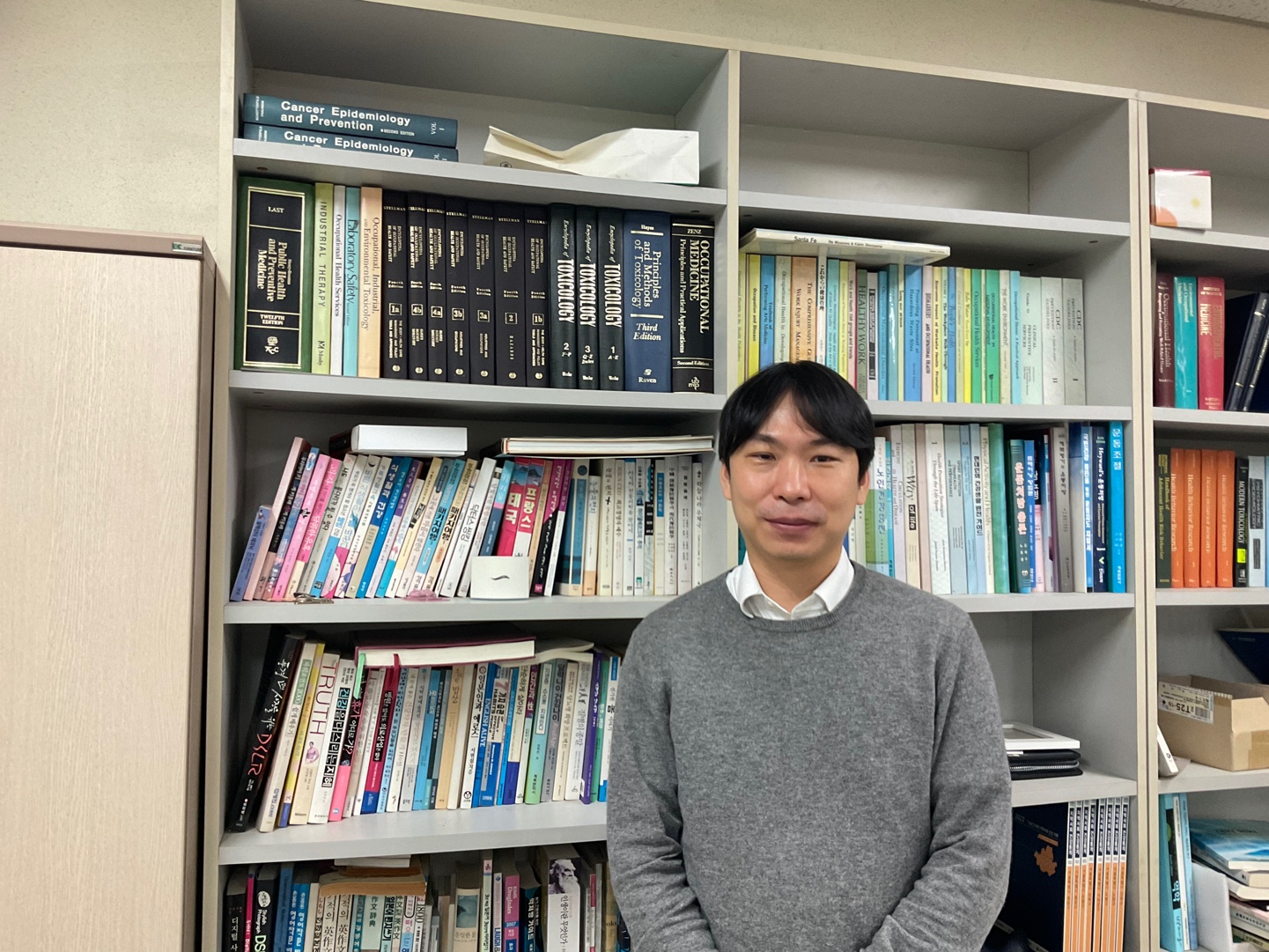지난 5월 25일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위원회에는 ‘게임 장애 (gaming disorder)’를 새로운 질병 코드로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 (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임 장애는 ICD-11 내에서 도박 장애와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 (disorders due to additive behaviors)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오는 2022년부터 권고될 예정이며, 국내에는 빠르면 2025년 즈음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WHO의 결정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장애를 질병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ICD와 함께 정신의학적 질병분류의 양대 문헌인 DSM(정신 진단 장애 매뉴얼: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에서도 2013년 개정판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 (internet gaming disorder)를 질환명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게임 장애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특정한 정신 질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에, 정식 진단명이 아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의 분류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이후 점점 게임 중독 및 과도한 게임 활동과 정신 질환 유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고, 과도한 게임 활동이 질병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2018년 1월 발표된 ICD-11 초안에 먼저 게임 장애가 언급되었으며, 이번 의결안에서도 그대로 포함되면서 게임 장애가 질병의 범주에 처음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게임 장애의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게임 하는 횟수나 시간 등을 통제할 수 없으며, 2) 일상생활이나 삶보다 게임을 더 우선시하고, 3) 개인의 삶, 가족 관계, 직장 생활, 사회생활 등이 무너질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도 게임을 지속하는 상태, 이 세 가지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게임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게임을 취미로써 즐기는 수준을 가지고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을 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되어야만 게임 중독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 장애가 ICD-11에 등재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각계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지난 6월 10일, 소아청소년과 학회, 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역학회 등 5개 학회가 ICD-11의 만장일치 승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에서는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 마련, 규제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게임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WHO에 게임 장애의 ICD-11 등재를 반대하는 서한을 두 차례나 보내고 방송사 토론에도 잇단 패널을 내보내는 등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프로게이머, 유튜브나 트위치 TV 등에서 활동하는 게임 스트리머의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며, 유명 스트리머인 대도서관 (본명: 나동현) 또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의료계 또한 앞서 언급한 5개 학회의 성명에서는 찬성의견을 냈지만, 그와 별개로 게임 장애의 ICD-11 등재를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개별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게임 장애의 질병 등록을 지지하는 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저명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 중독에 빠지면, 다른 행위 중독 (예: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보상, 동기, 인지조절, 기억 등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강화되고, 해당 부위의 도파민 회로가 변형되어 결국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여타 행위 중독 상태와 마찬가지로 질병적인 상태이며, 게임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게임 중독은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또한,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 게임 장애가 질병 코드로써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게임 중독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게임 중독인지 정의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연구마다 집단 설정이 제각각이거나, 혹은 다른 분야의 중독 진단 기준을 그대로 게임에 적용해왔기 때문에 명확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진단 기준을 설정한다면, 실제로 게임 중독 상태에 이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연구가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장애의 질병 등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게임 산업의 축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임 업계, 프로게이머 및 인터넷 방송인,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가장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게임 장애의 질병 화를 받아들인다면 자칫 ‘게임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게임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은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문제 (성격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게임’ 자체의 문제로 몰아가 게임을 규제하고 게임 산업을 억제하는 이른바 ‘게임 죽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진단 기준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나 수치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혹은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진단 기준의 적용이 임의적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게임 장애의 질병 등록은 비단 의학계 내에만 국한되어있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다. 서로 다른 성향의 정치인들, 게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계된 정부 부처,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로비스트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있다. 이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까지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일수록, 문제의 본질은 무시되고 엉뚱한 논란만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 즉 게임 장애의 질병 등록의 필요성과, 그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들을 명확히 밝혀내고, 득과 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국내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현석 기자 / 울산
giants_so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