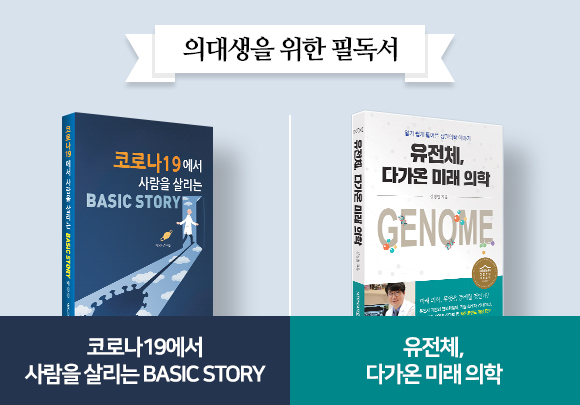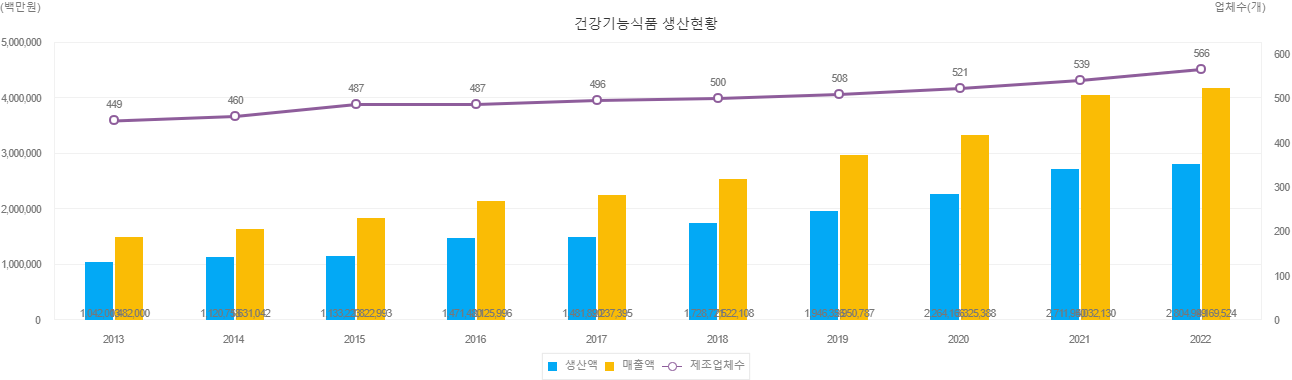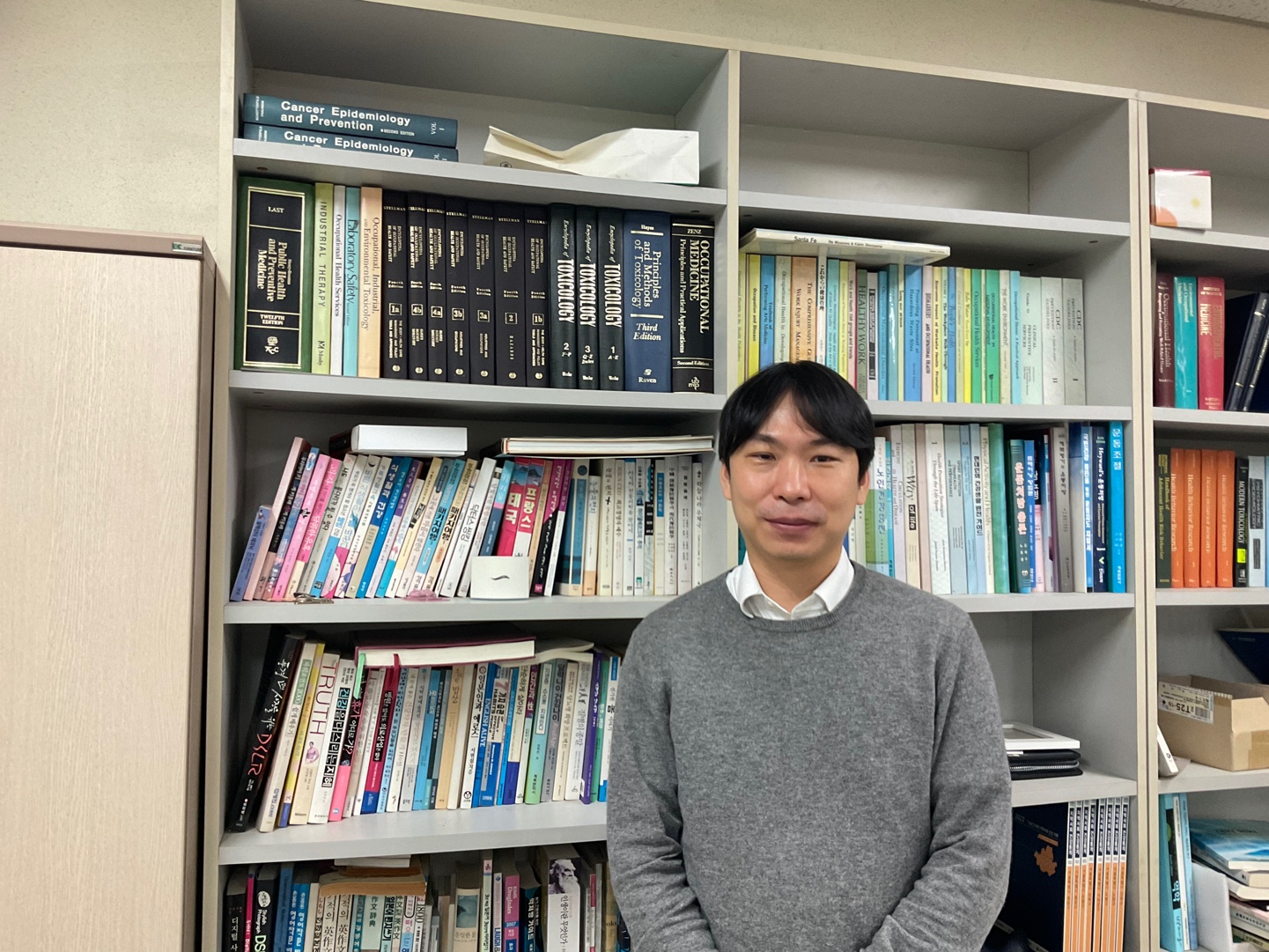괜찮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병원에서 실습을 돌며 느낀 점은 세상엔 정말 많은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 내가 본 ‘괜찮은 죽음’은 손에 꼽는다. 아니,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괜찮은 죽음은 무엇일까? 평생 열심히 일하여 큰 부를 거닐고 풍족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괜찮은 죽음일까.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살다가 외로이 혼자 죽어가는 것은 괜찮은 죽음이 아닌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괜찮은 죽음이라고 보는 걸까?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대로 그곳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현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반적인 수용시설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호스피스의 어원은 라틴어의 호스피탈리스(hospitals)와 호스피티움(hospitium)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호스피탈리스는 ‘주인’을 뜻하는 호스페스(hospes)와 ‘치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호스피탈(hospital)의 복합어로서,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의 뜻을 지닌 ‘호스피티움’이라는 어원에서 변천되어 왔다. 현재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말기 환자는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고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1차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했다.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통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었고 그 대상자가 ‘말기 환자’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말기 환자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자 중 의료진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받은 환자를 뜻한다. 하지만 병상 수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자가 태반이며 관련 인프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사회 인식, 의료와 복지 연계 부족과 같은 이유로 실제 지방에서는 제대로 안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괜찮은 죽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제도 중 하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뜻한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로, 연명의료 결정의 이행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은 “임종 과정” 환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번째로,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요양 병원과 같은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문제가 있다.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결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쉽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다’며 ‘연명의료결정은 결국 가치의 문제이다.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던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말기 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설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고 있다.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무엇인 괜찮은 죽음인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죽음 하나하나는 허무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무엇 하나 괜찮아 보이는 죽음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포기해야만 할 때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괜찮은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출처 : pixabay)
박유진 기자/순천향
<park.yj09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