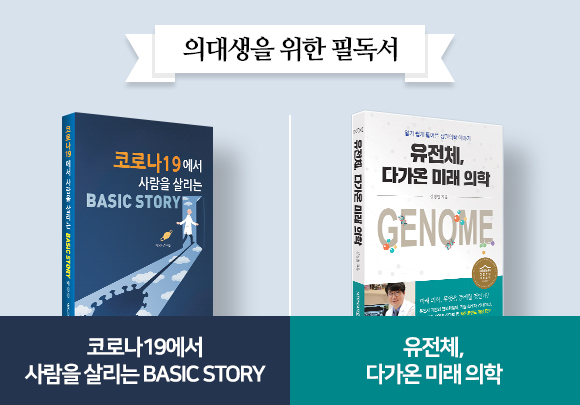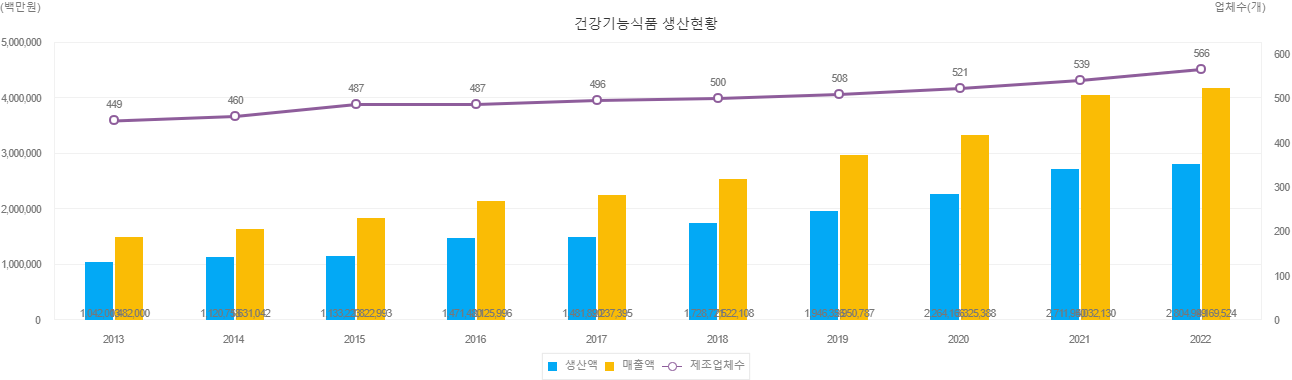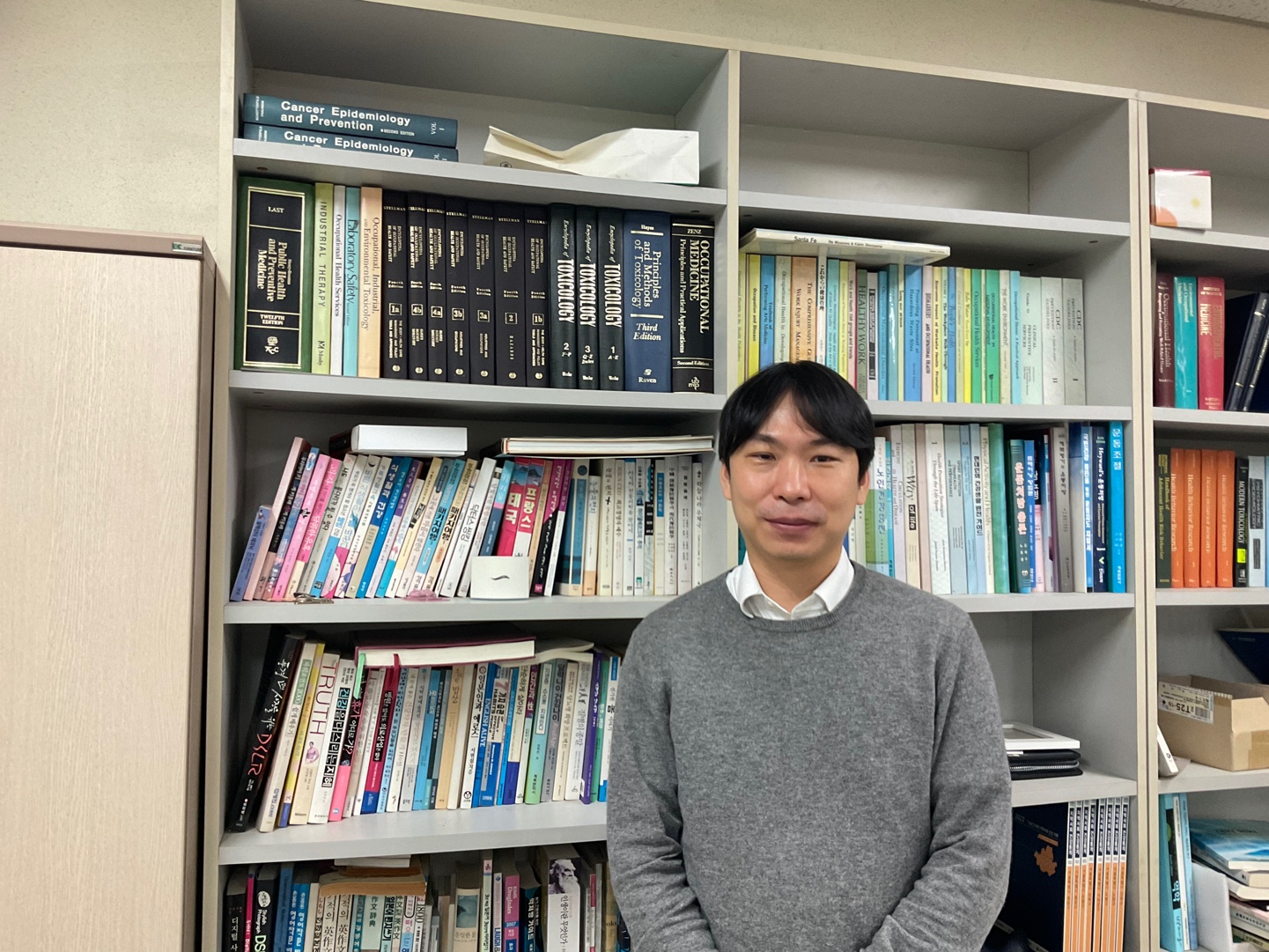최근 필수의료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란 어떤 의료를 의미하는것일까?
필수의료라는 말의 학문적 정의는 찾기 쉽지 않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이러한 말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 “Essential health service”, “essential health technology”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Medline 검색을 해볼때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는 문헌을 찾기힘들다. WHO가 말하는 필수의료기술을 필수의료로 간주 할 때 그 정의는 ‘건강문제들을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근거기반 기술들’로 정의한다. WHO가 추구하는 보편적의료보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적 곤란함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른 보편적 의료보장은 그 해당 보건의료체계의 전체 국민(집단)에 대하여 두 가지 상관성 있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데,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전체’와 ‘재정적 고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함’이란 두 요소이다.
Essential health services를 검색해보면 UN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하나로 설정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인구집단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생식, 모성, 신생아, 소아, 감염성,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진료가 제공돼야 하고 서비스 제공 능력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공중보건학적인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은 그 기본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66번째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다 자세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우선 순위가 높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에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았다.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중증,희귀난치질환, 중증 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여부를 전문과목으로 정하려는 시도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필수의료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내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필수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년과를 뜻하는 의미로 쓰여왔다. 법적으로도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이들 4개과 중 3개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9년부터 외과와 함께 수가 가산을 받고 있는 흉부외과도 필수의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의료계 상황이 변하면서 필수의료과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비뇨의학과는 복지부와 필수의료과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필수의료협의체에 비교적 최근에 합류하며 필수의료로 ‘인정’ 받았다. 환자사망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들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신경외과다. 정부가 최근 필수의료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별 과목의 학회들이 경쟁적으로 필수의료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문제도 있다. 특정 분야만 필수의료로 정의해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과 의사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 차이도 문제이다.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은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할 ‘질환’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로서 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에 해당하는 정확한 의료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요즘 부쩍 필수의료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력은 충분한 데도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의료를 하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도 일정부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증, 응급,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오예지 기자/차의전
yjsky2014@naver.com